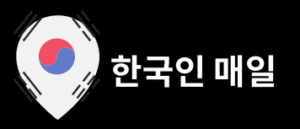대전과 충남의 통합으로 교육감 선거가 역대 유례없이 후보 검증이 힘들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일보 그래픽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 논의가 아닌 정치 공학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의 현안과 비전은 실종된 채, 선거 방식의 유불리 계산만 난무하는 현실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진다. 후보자들은 통합 교육감이냐, 복수 교육감제냐를 놓고 학생과 교사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당락 가능성부터 따지는 모습이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효율성 논리에만 매달릴 뿐, 통합 이후 교육 체계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논쟁은 교육감 선거 방식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낼 정치적 이득과 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된 교육감 선거는 그 자체로 왜곡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방식이 정리된 이후에 닥칠 혼란이다.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가 늘 그랬듯,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단일화 논의가 선거판을 다시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 철학과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는 구도가 반복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 방식 논란에 단일화 논의까지 겹친다면, 유례 없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혼선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주민 동의 없이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교육감 선거 방식을 조속히 확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 본연의 논의가 이뤄질 교육감 선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충남 지역에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교육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체제 구축,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같은 기존 현안에 더해, 행정통합에 따른 학군 조정과 교원 인사 시스템 재편, 지역별 교육 정책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시민사회와 언론 역시 선거 방식이나 단일화 여부를 진영 논리나 흥미 위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교육 역량과 비전을 꼼꼼히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례 없이 교육이 사라진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